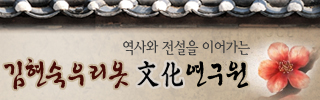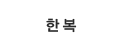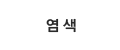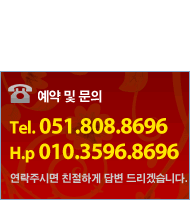"시를 통해 우리옷의 비밀 담아내고 싶어요" 지난해 계간 '문학시대' 통해 시인으로 데뷔
공부방 갖춘 부산 초읍동서 한복 제작 매진
"마음 열면 개업이고, 마음 닫으면 폐업 아닌가요. 지금 이곳에 옷가게 간판을 걸어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폐업한 것은 아닙니다. 아는 이들로부터 옷을 지어달라는 부탁이 오면 즐겨 짓고 있지요.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것은 이제 옷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옷을 지으면서 그 옷을 입을 지인들과 더불어 옷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고요. 시를 공부해 시인이 된 것도 옷에 담긴 비밀을 시라는 방편을 통해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롯데호텔 등 부산 서면 일대에서 김현숙우리옷문화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우리옷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온 김현숙(50)씨는 지금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물러나 앉아 있다. 정원이 작은 언덕을 이뤄 옷 짓고 사람 만나는 공간이 사뭇 언덕 위 별장처럼 보이는, 그리 크지 않은 주택을 개조한 이곳에 머물러 온 지 6개월쯤이라 했다. 집 밖의 좌청룡 우백호, 보이지 않는 집 안의 현무와 주작이 새겨진 네 기둥 위에 치솟은 대문이 여느 주택과 달라 보이게 하지만 그렇다고 옷을 연구하고 짓는 곳이라 가늠하기에는 그 흔적과 종적이 묘연하다.
"우리옷을 많이 입히는 것보다 잘 입히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제 옷을 찾아주셨지요. 대승고덕 예인 문화인을 비롯하여 유명정치가 경제인 등에 이르기까지 옷을 해간 분들이 많습니다. 옷에 대한 담론을 나눌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초가 되고 등불이 되는 이들을 이제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옷에 대한 저의 공부도 더욱 깊어지겠지요."
실제로 초읍의 그 집은 공부방을 떠올리게 했다. 사랑방과 수행처가 먼저 눈에 밟혔다. 다담을 나눌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안채에 있고, 대문 옆 별실에는 내면으로 향한 공부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 수행공간을 마련해뒀다. 법당이라면 법당이고, 명상공간이라면 명상공간이 될 법한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한다.
"부암동의 연구원에서도 그랬지만, 이곳에서도 따로 공부방을 둔 것은 심지를 찾으려는 뜻에서입니다. 옷짓고 밥하고 노는 것 모두가 마음 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옷의 비중이 다만 클 뿐이고요.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일상의 활동이 흘려보내는 것이라면, 가만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이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흘려보내는 활동 못지않게 고이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기에 법당이자 명상공간인 공부방을 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 그녀가 얻은 한소식은 무엇일까. "우리옷 용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버선이나 신발의 앞쪽에 나 있는 것을 코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지요. 얼굴의 도드라지게 높은 코가 아래의 코버선 코신발과 만날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서로 호응하라는 뜻이 거기에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옷은 사람 모양을 닮은 삼각형의 안섶을 늘 달고 있는데, 섶의 고어가 건너가다는 뜻의 섭이라 하더군요. 조상 천도를 잘해야 마음이 편하다고들 하는데 건너간다는 뜻의 천도와 섶의 연관성은 없을까, 배꼽 단전을 가려주는 편안한 섶의 의미 등에 대해 고민하곤 하지요."
우리옷을 만든 지는 20년 이쪽저쪽을 헤아린다고 한다. 처음에는 양장디자이너를 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토털패션 개념으로 우리옷에 눈떴다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던 89년께 완전히 우리옷으로 돌아섰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중국에서 삼베나 모시 등 과거에는 비싸서 입지도 못하던 옷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옷의 선과 멋을 파괴한 옷들이 우리 거리는 물론 외국 거리에서 횡행하기 시작했지요. 우리의 선을 살린 바른 옷을 해 입혀 국내는 물론 해외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복에 더욱 깊이 들어갔습니다.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편안하여 건강에 좋고, 장롱에 넣어두는 옷이 아니라 싫증나지 않고 계속 입을 수 있는 검소하고 기능적인 옷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요. "
그러다 만난 것이 천연염색이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당시로서는 천연염색을 배울 길이 없이 오직 마음 하나로 매진했다고 한다. "천연염색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천연염색을 통한 우리옷은 곧바로 요즘의 웰빙옷 아니겠습니까. 한 3년 두문불출하고 재료를 아끼지 않고 천연염색에 정성을 쏟았지요. 염색하다가 옷에 불이 붙기도 했는데, 이대로 등신불이 되어도 좋다는 각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고통이 별이 되어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환희, 참된 고통이야말로 진짜 환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 전통의 색인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오방색이 나왔습니다. 땅의 색깔은 황이고 하늘의 색은 청인데 땅의 기운이 많고 하늘의 빛이 적으면 연두가 되고 그 중간쯤이면 짙은 초록이 나오는 등 계절의 변화가 옷의 천연염색으로 표현되었지요. "
옷연구가는 지난해 계간 '문학시대'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마음씨 착한 시인이 옷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그녀는 "옷에 담긴 비밀을 시에 담고 싶다"는 새로운 희망을 끄집어냈다.
임성원기자 forest@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2.17. 10:26 / 입력시간: 2007. 12.17. 10:26 |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1217/0B0020071217.102910264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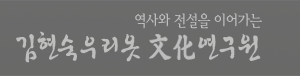
-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460-2번지ㅣ TEL. 051-808-8696 H.P 010-3596-8696
- Copyright © 2012 김현숙우리옷문화연구원. All rights reserved.